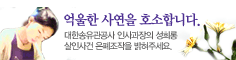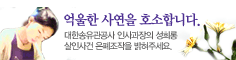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






나의 하늘은 그 어디에 있을까
허주 김 정 희
오랫만에 만난 연건동 28번지 사람들 나는 어떤 하늘을 그리고 있는가.
늘 늘 푸르른 하늘 그런 사랑을 하나 꿈꾸고 있다.
하늘은 언제나 하늘 이어야 한다.
마흔 한살 바쁜 하루 나는 아! 삶은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살아서는 안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해.
그 순간 나의 눈에서는 81년 봄 어느날 첫 남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마지막 사람을 생각하니
앞이 끔찍 했었고 생명은 그 자리에 없었다.
왼손을 칼로 자르기도 했다.
죽음이란, 아무나 하는게 아닌지---.
살아있는 내 자신이 너무 너무 싫었다.
순결이 무엇일까?
육체적인 순결을 어거지로 가져간 사람에게 평생을 맡겨야 한다는 게 삶은 삶이 아니고 어둠만 남아 있었다.
첫 남자는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도 말 할 수 있을까?
나는 첫 남자에게 말했다.
너는 육체적인 순결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순결을 가져갈 사람이 생기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것이다.
한번 잘못 되어진 길을 어디에서부터 잡아야 하는지.
자신이 하나도 없었다.
나를 내 팽겨쳐 버리고 구겨 버리고 싶었다.
그런 하루였다.
눈에 한 가득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늘을 보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건 삶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 해야 해.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 나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혼자 울고 있었다.
흑 흑 흐 흑 ---.
'87년 가을 어느날 바람처럼 다가온 첫 사랑.
세상에 전기가 이분만 꺼져 주었으면 했다.
지금 첫 사랑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작년 어느날까지 단 한번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사랑을 첫 사랑을 생각만 했다.
마흔 한살 그 눈물속에도 첫 사랑을 녹이고 있었는데 ---.
그곳을 지나가던 뜻밖에 과학원 노선생님이 내앞에 서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 보다니, 웬 일이세요.
천연물과학연구소에 볼 일이 있어서 ---.
눈물이 멈추워지지 않아 흐르는 그대로 이야기 했다.
이야기 끝에 말했다.
첫 사랑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래, 혼자서 살겠노라던 첫 사랑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해 겨울 망년회를 하자고 했다.
첫사랑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제 결혼도 하셨는데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풀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네가 약속 잡아라.
나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같이 마셔보자.
하지만 약속한 그날 아침 전화가 왔다.
누나 이상해요.
약속은 안 될것 같아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전화를 했더니 말도 안하시고 한숨만 쉬다가 끊으셨어요.
누나가 전화해 보세요.
무슨 일일까.
첫 사랑이 만나 보자고 했는데 ---.
전화번호 물어서 전화를 했다.
저예요.
목소리가 무겁다.
아니,정신이 나가 울고 있었다.
동생이 어제 강도에게 당해서 죽었어.
그 순간 나에게 전해지는 전율.
아! 그렇구나.
내가 말했던 그대로가 실제로 일어나는 구나.
말은 언젠가는 그대로 된다는 걸 한번 더 확인했다.
가슴이 많이 아파서 아는 선생님들에게 가보라고 전했다.
지난 달 노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9년만에 만남이었다.
며칠 후 노선생님은 마지막 말로 첫사랑과 셋이서 소주 한잔을 하자고 했다.
노선생님은 첫 사랑과 내 사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
어제 노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선생님. 광주 아빠가 5월 5일 돌아 가셨어요.
그런데 왜 전화 안했어.
서울 대표로 노문영선생님께서 내려오셔서요.
연휴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라서 다 일 해야지요.
노문영선생님은 누군데, 왜?
아빠가 돌아가시기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만나자.
그래요.
셋이서 소주나 한잔해요.
선생님들은 요즘 어디서 마시나요.
강남역 부근.
강북까지 넘어 오기는 그렇겠지요.
제가 강남으로 갈테니 제가 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셋이서 만나요.
김선생님과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전화해서 시간을 잡고 전화줄께?
그런데 와이프가 많이 아프데 ---.
그래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안 아프나요.
그 선생님들이 어쩌면 더 많이 아파요.
알면서 아픈 걸 보아야 하니 그렇지요.
23년이 흘렀다.
첫 사랑도 23년이 되었다.
나를 많이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사랑은 하나라고 애써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 왔다.
그동안 내 사랑의 주인공은 첫 사랑 이었다.
마흔 아홉을 지나면서 나는 지천명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내야 하나.
아무리 보냈노라고 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보따리 두개가 꽁꽁 묶여져서 필요할때 마다 풀어보면 역시 그대로 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도 두개 보따리들을 꺼내 보았다.
다 없애 버리고 싶었다.
방법이 없을까.
전전긍긍 했었다.
그러던 겨울 어느날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도중
나는 즉시 마음의 눈으로 보따리 두개를 꺼내서 길에 놓았다.
하늘에서 한줄기 빛이 내려와 보따리 두개를 하얗게 태우더니
흔적도 없이 보따리는 내 눈 앞에서 순간 사라져 버렸다.
가슴이 텅하니 비워져 버리고 마음이 먹먹했다.
후련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잔영이 남아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 보았다.
어두움이 가버린 마음은 멍하고 먹먹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새로움으로 텅 텅 텅 하고 비워버린 마음을 채워야 해.
그날 이후 맑은 하늘 하나가 있기를 늘 기도했다.
나의 하늘은 그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하는 마음되어 보니 새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사랑 하나 나에게 찾아와 모든 걸 새롭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만져 보라고 할것 같다.
꿈꾸었던 꿈이 이루워지면 사랑해야지.
하늘 늘 푸르게 있고 나는 그 하늘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