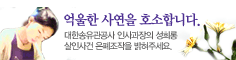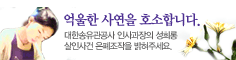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





편지
허주 김 정 희
나는 작년 치우천황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
그리고 살아 있어서 삭발을 하고 아들에게 삭발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달라고 했다.
머리야.
기르면 된다.
하지만 마음 상처는 누가 알까?
다른 이들이 안다고 말하는데 알까.
모를까.
어제 광주 엄마가 집을 오셨다.
꼴통 나는 그동안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같이 살고 있는 언니가 불편하다면서 유선 전화를 놔 주었다.
받을 수 만 있는 전화.
그래.
전화가 없었던 시절.
40년전만 하더라도 전화를 할려면 면에 가야 했다.
나를 만나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라.
있다가 없으면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불편하다.
차가 없으니 그렇다.
차 생길때 까지 광주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너무 불쌍해진 건 아닐까?
백설공주가 보이지 않는다.
아플까?
왜 보이지 않는거야.
황금이도 보이지 않는다.
새끼를 어디에 낳았을까.
출근하는 나를 보며 날마다 멸치와 오징어 다리를 달라고 했는데.
블랙으로 살아가다보니 블랙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창고 방을 치울테니 그냥와서 사세요.
어차피 치워야할 방.
한사람이라도 어려울 때 돕자.
물질은 없으니 방이라도 내주자.
그렇게 치우는 쓰레기로 버릴뻔한 아들 편지다.
나가서 쓰레기 중에서 뭐야? 하고 꺼내서 보니 아들이 내게 보낸 편지다.
2000년 아들이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받아본 아이큐검사
정신과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도 똑똑하게 들었다.
자는 아이를 깨워서 나에게 한 행위를 보게 했다.
문제는 없을까?
알러지 내과 민경업선생님과 상의를 했다.
정신과에서 둘다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셨다.
나도 몇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설문지를 보았다.
아들도 같은 시간 검사를 받았다.
진단결과 아이는 정상인데 엄마인 내가 더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쩌면 내가 더 아프고 환자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한다.
야생초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얼마의 시간을 보냈기에 이런 글을 쓸까.
많이 아파 보아야 사람이 되려는가.
이젠 그만 그만 ---.
무얼 바꾸어야 할까.
그래, 그래.
마음을 바꾸자.
삶은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달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바리깡이 없어서 머리가 그렇다.
치우천황 아들은 지금도 내가 머리를 잘라 주기 바란다.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어느날은 엄마만 열번 이상 부르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한다.
어제 직원이 편지를 보면서 낄낄대고 웃는다.
아들에게 주는 게.
나는 자유라고 말한다.
네 인생은 네것이야.
알지?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
대학이나 갈까?
고등학교는 갈 수 있을까?
치우천황 우리 외갓집 동네에 내려가서 살자?
시골은 싫어요.
일년에 몇번 가는 게 좋아요.
산소에 가서 맨날 좋아하면서 잘노는 아들.
어릴적 추억이 남는게 뭘까?
컴퓨터!!!


대성전앞에 부부나무가 사랑을 이 여름에도 하고 있다.
덥지도 않는지 ---.
껴않아 주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은 어쩌면 더위보다 더 큰 그늘인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