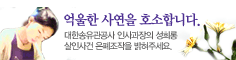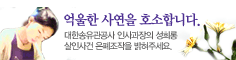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
영랑호에 철새는 날아가고 겨울은 깊어간다
우근 김 정 희

동해로 동해로 동해바다를 보러 속초로 떠났다.
양평을 거쳐서 백담사가는 길을 지나서 구불구불 거리는 처음처럼느껴지는 길을지나서 미시령 터널을
빠져 나가자 속초가 있다.
네베게이션으로 흐르는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에 동행들과 한참을 웃는다.
2800원이래요? 참 돈있나?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들 바뀌어 간다.
2000년의 양미리를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시 속초로 아니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가슴이 뛴다. 얼마나 가고싶었던 보고싶은 바다 수평선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만해도 꿈을 꾸는듯
나는 얼굴에 미소가 그윽하고 마음은 이미 파도소리로 가득차 있다.
2000년도 때 눈이 펑펑 쏟아져서 오음리에서 밟았던 크락션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삶이란 주어진 운명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고 했던가!
모두 모두들 갈때는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양미리를 구워먹기로했다.
그날에 추억이 너무나 잊혀지지 않기에 --- 그때는 8명이 카니발에 몸을 실어서 하조대의 한 가정집을
빌렸었고 이번에는 5명이 속초 영랑호 별장을 빌렸다.

도착을 해서 까지 영랑호 리조텔인지도 몰랐다.
키를 받아서 한참을 천천히 가서보니 B136호가 나타난다.
양쪽 옆집들에는 벌써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차로 천천히 오면서 영랑호의 잔잔하고 조용한 전경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았다.
해탈로님께서 댓글에 남기시기를 영랑호를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나는 속초에 호수를 보러간것이 아니다.
동해바다에서 머리를 담그고 싶어서 갔었다.
그때까지만해도 호수를 보러온게 아니라며 같이 간 동료들에게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영랑호도 참 좋은가봐라는 이야기를 했다.
동명항에가서 회를 사고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조개와 물고기 한마리의 곡예를 디카에 담았다.
저녁을 먹고 이슬이로 머리를 식히며 바라다보는 영랑호수의 잔잔한 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가로등의 길이가 길어질 수록 밤이 깊어져가는 걸 보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취하고 이슬이에 취하고 나는 나의 먼 나라에 취한다.
가까이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 인연이란 깊은 나라로 들어가라고들 하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도
안하지도 못하는 시간이 아쉽고 막연하게 구름으로 다가온다.
이럴때 혼자가 아니였으면 하는 생각도 한자락을 차지하고 나는 새벽에도 찬서리를 맞고 서있는
가로등의 긴나긴 호수에 비친 잔영에 떨고있는 나를 본다.
한번쯤 한번은 오겠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다음날 아침을 먹고 영랑호를 걸어보자는 제의를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호수주위를 산책을 30여분 하고 왔는데 너무나 경관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서 햇살에 비친 호수는 하늘을 담아서 나를 호수가로 내려가라하고, 내려가서 보니
호수에 담겨져있는 하늘은 외할머니 품속같이 따뜻하다.
어머니의 품속보다는 외할머니의 품속이 나는 더 따뜻했다.
다시 그품속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가져다가 대어주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화롯불에 계란밥을
여기에서 호호호 불어가며 먹고 싶었다.
디카로 담아내는 영랑호의 겨울 풍경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겨울 햇살에 나를 안겨보았다.
호수에 그대로 비추어져서 나는 호수품에 안겨서 한없이 가없는 잔잔한 여울에 취해있었다.
많은 사념덩어리를 놓아버려야 했다.
지금은 혼자라는게 어색하고 아쉬웠다.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했었고 누군가가 옆에서 살짜기와주기도 바라지만 멀고도먼 험했던
어제로 나를 보내기는 싫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게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한켠에서 이렇게 시리고 아프고 어두운 계절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멍한 눈에서 그렁그렁한 눈물 한줌이 내려오려 한다.
나는" 할머니 나 힘들어 안아줘."
할머니가 한걸음에 달려와서 덮석 안아줄것 같아 나는 그 품속에서 엉엉하고 깊은 눈물을 흘리고 싶다.
여행을 하면서 혼자라는게 어떨때는 몹시도 싫어진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일행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영랑호를 바라다 본다.
자연이 안겨다주는 포근함에 철새들이 장관을 이루며 내앞에서 파노라마를 펼친다.
나는 철새들에게 함몰되어서 시간이 흐르는걸 잊어버렸다.
자연의 치유력에 어마어마한 배려에 풍덩 빠져 버렸다.
생각에 빠져있는 나를 뒤흔드는건 갈대를 스쳐가는 바람소리였다.
일어나서 호수에 떠있는 구름속에서 살며시 얼굴을 드러내는 해를 보았다.

두눈을 뜨고서 쳐다보아도 되는 물속에서 기대고 싶어진다.
해를 보아도 눈이 전혀 부시지 않는다.
철새들이 날아오고 겨울은 깊어만 간다.
낙엽이 소란거리며 날아오르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지나간다.
철새들이 춤을 춘다.
겨울이 시름을 놓으면 살얼음 위에서 곡예를 하듯이 걸어가는 새 아니 천천히 뛰어다니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듯하다.
겨울여행은 영랑호의 철새들로 나를 들여다보며 말한다.
삶은 그자리에서 그대로 살아서 있다.
철새들이 추는 군무에 나는 그만 잊혀져버린 품속에서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그 품속으로 안기고 싶다.
고독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시름을 놓아도 되는 영랑호의 하늘은 오늘도 내일도 푸르른 마음으로
다가선다.
여행은 이렇게 시름덩어리를 버리고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곳으로 가야한다.
영랑호는 그런면에서 내게 새로운 꿈을 꾸게했다.
몇 시간을 한곳에서 놀았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철새가 푸드득하고 날아가고 천둥오리는 날개짓만 하다가 그냥 그냥 유유자적하며 떠다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