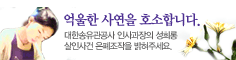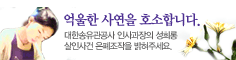|



[동방30]수화의 그림 철학
우근 김 정 희
수화도 그림을 그리다가 수없이 날려버린 종이조각을 생각할땐 좌절감과는 반대로
또 다른 의욕이 불탄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수화는 진실로 커다란 좌절감을 맛볼적마다 이런 생각을 해낸다.
세상이 자신을 더 커다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라고 생각해 낸다.
세상은 모래알처럼 많은 공기보다 무수한 영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태어나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수화는 항상 인생의 대전제를 내걸어 놓고 그녀는 어느쪽인가를 생각해 본다.
나는 무엇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무엇으로 세상에 보답해야만 하는가.
세상이 나를 원하는가.
내가 세상을 원했을까?
인생이란 어차피 짜여진 운명속에 쳐넣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삶의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없다.
그녀 자신밖에 그녀의 삶을 살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관념에 쌓여진
그녀의 20여년의 생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었다.
확고한 삶이란 전철에 대한 확실한 의지였다.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이성과 감정은
인간의 야누스를 이야기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림에서 말하면 종이와 물감같은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비와 눈같은 그런 것이다.
오늘처럼 비가 주룩 주룩 내린다거나 흐린날이 되면 수화는 긴긴 편지를 쓰곤 했다.
이런 날이면 누군가를 연모해 버리고 싶기도 하고 완벽한 사랑,완전한 사랑,루이저린저같은
작가가되어 보고도 싶었다.
고2때 루이저린저는 수화의 환상이었다.
환상하기 좋은 시기였다.
대학은 반 사회인이였고 사회로 뛰어들 준비단계에서 악을 쓰고,방황하고,즐기면서 다니는것 같았다.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리를 쑤셔 박다가 전화선을 연결 시켰다.
짱깽이라도 먹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중국집에서 애써준 성냥갑의 전화를 돌려 놓고
짜장면 1개를 시키고 수화기를 놓자마자 전화통은 불이나 나버린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